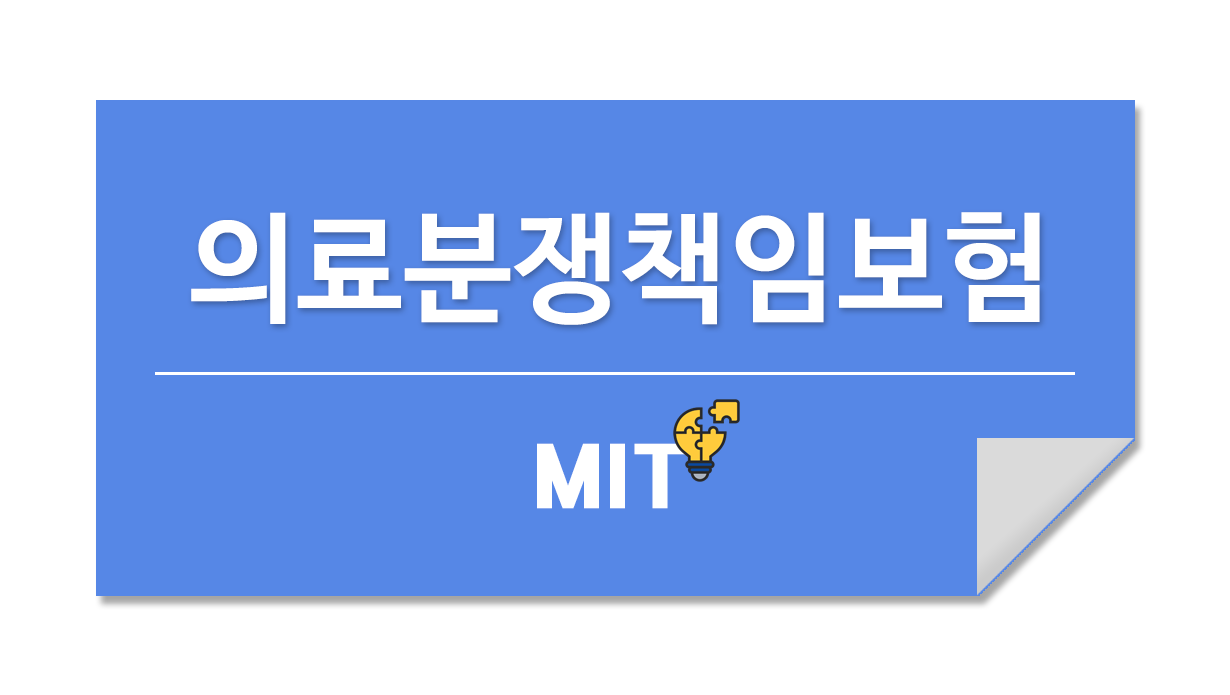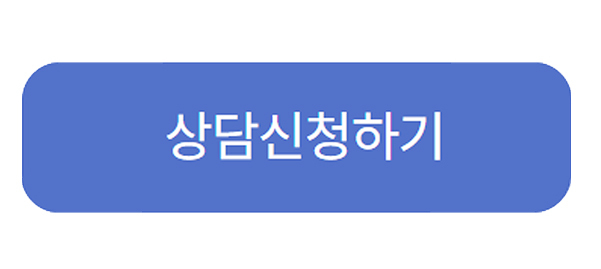MIT(Medi Information Teacher)
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과 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내준 배상금, 나중엔 누가 갚을까?
국가가 대신 내준 배상금, 나중엔 누가 갚을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代拂) 배상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대불액은 약 6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액이 아직 의료인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환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안전망이다.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결정됐는데, 의료인이 재정적 이유로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문제는 그 돈을 “국가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대신 내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구상금 형태로 의료인에게 청구된다.
⚖️ “국가가 내줬지만, 결국은 의사가 갚는다”
법적으로 보면 대불제도는 국가가 의료인의 ‘대신 변제자’로서 역할을 하는 구조다.
즉,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배상금이 정해지면,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나서, 이후 해당 금액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구상(상환 청구)한다.
그동안은 이 구상 절차가 느리고 회수율이 낮아 실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국회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이 구상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 독촉, 분할상환 관리, 심지어 법적 강제 집행 절차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
💸 의료분쟁은 끝나도, 재정 리스크는 남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원의·병원장이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 이후에
이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미 환자와의 조정이 마무리되어 안도하던 순간,
몇 개월 뒤 국가로부터 ‘대불금 상환 안내문’이 도착한다면 어떨까?
조정 절차에서 의료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상 의무자로 남기 때문이다.
이때 상환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의료인의 개인 재정, 병원 운영자금, 현금흐름에 직접 타격이 발생한다.
의료분쟁책임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은 흔히 ‘배상금 보장용’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대불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음 항목이 보장된다:
|
구분 |
주요 보장 내용 |
|
손해배상금 담보 |
환자에게 확정된 배상금 지급 |
|
법률비용 담보 |
조정·중재·소송 중 발생한 변호사·감정 비용 |
|
구상권 청구(구상금) 대응 |
국가(중재원) 대불금 구상 시 보험사가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부담(약관별 상이) |
즉, 분쟁이 끝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제2의 청구 리스크’를
보험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 의사라면 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 내 보험 약관에 ‘대불 구상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일부 상품은 조정·중재 비용만 포함하고, 대불 구상금은 제외되어 있음. - 조정·중재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되는가?
→ 수사나 재판 전 단계에서의 방어 비용이 큰 차이를 만든다. - 한도와 자기부담금 구조는 합리적인가?
→ 최근 고액 분만·신생아 사건의 평균 배상금은 1억 원을 넘는다.
🩺 정리하자면
대불제도는 의료인에게 일시적 완충장치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국가가 대신 내준 빚을 의사가 갚는 구조”다.
구상 강화가 예고된 지금,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이 재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단순히 ‘보험 가입’이 아니라,
“대불 구상까지 포괄하는 설계”다.
의료분쟁의 시대,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