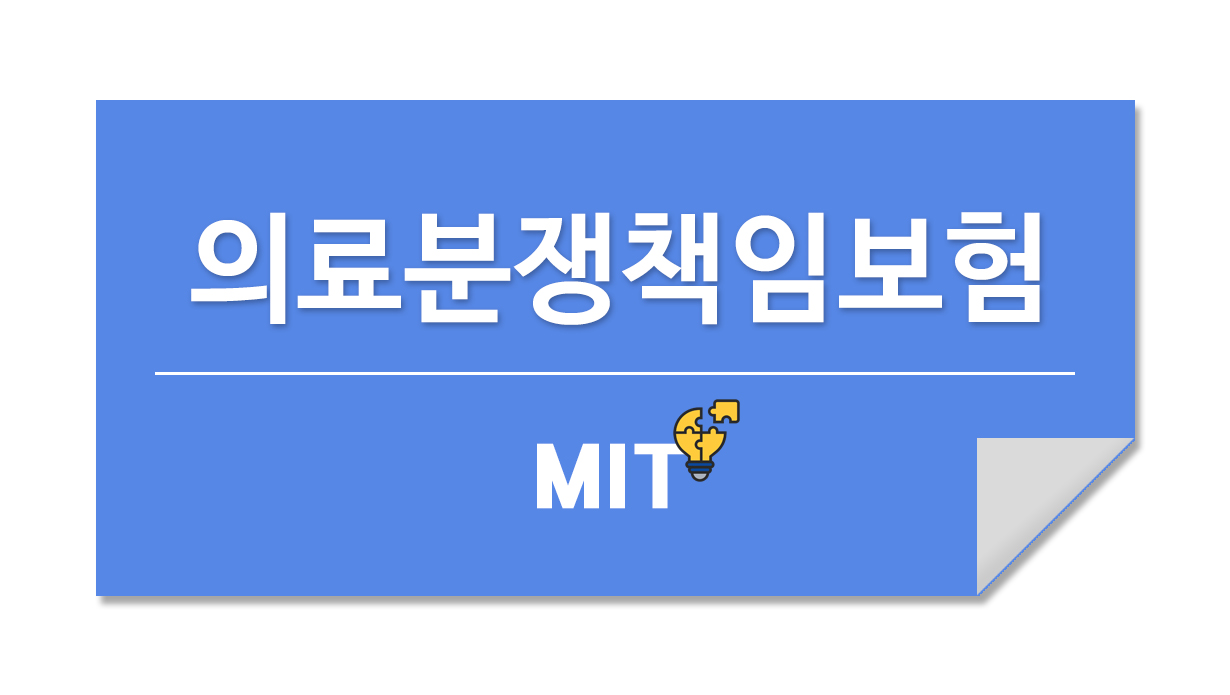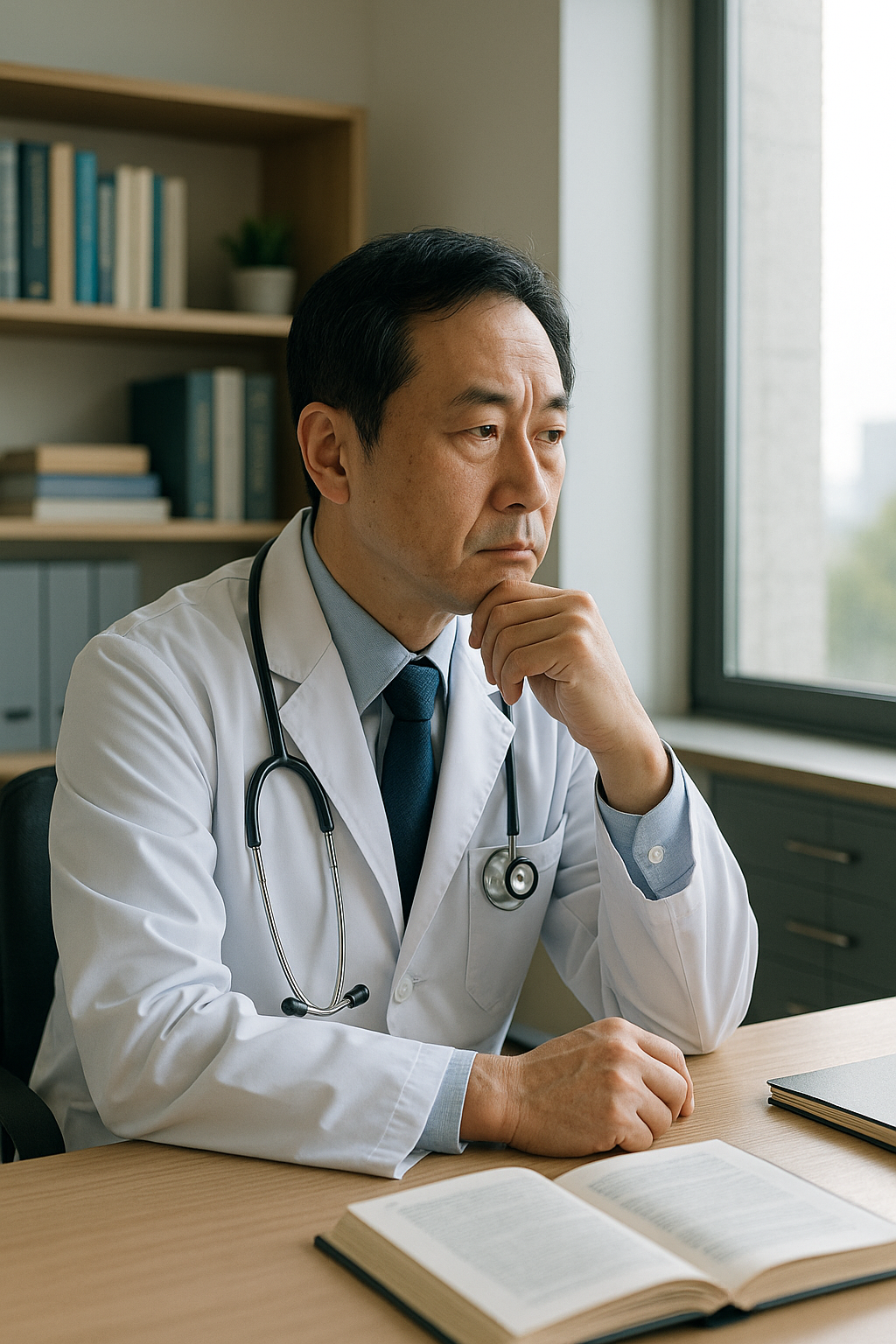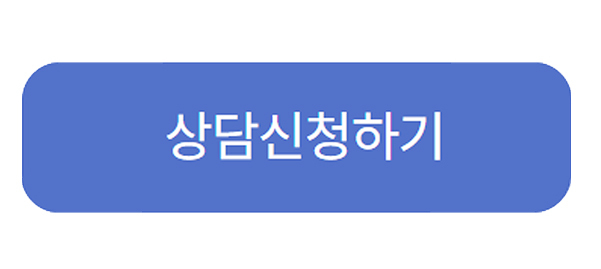MIT(Medi Information Teacher)
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과 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이제는 개인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 무과실 보상제 확대 논의
의료사고, 이제는 개인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 무과실 보상제 확대 논의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단체의 보상 요구와 의사들의 법적 불안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 결과가 나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무과실 보상제’입니다.
무과실 사고란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 기준(표준 진료)을 충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과 분만사고와 일부 산업재해 보상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무과실 보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진료 영역은 여전히 ‘개인 책임 소송’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가 책임 보상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뉴질랜드가 대표적입니다. 뉴질랜드는 1974년부터 국가 차원의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제도를 운영하며, 무과실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고,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공 사례
실제 불가항력 산과사고 보상 사례를 보면,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 예기치 못한 태아 저산소증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불가항력적 산과사고로 판정되어 무과실 보상제 지원 대상이 되었고, 환자 가족은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
반면,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합병증 사건은 무과실 보상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의사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과 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며 심리적·재정적 압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과실 보상제가 확대되면 의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소송 리스크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보상 범위 확대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 무과실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은 여전히 개인 소송 위험에 노출됩니다.
- 제도와 무관하게 의사의 평판 관리·병원 이미지 손상 방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도 확대를 반기면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점검, 리스크 관리 매뉴얼 구축, 환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무과실 보상제 확대는 의사에게 분명한 호재이지만, 모든 위험을 제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특히 개원의나 특정 전문과의 경우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료 영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보험·법적 대응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한국경영전략연구소 드림 –